소설 장르가 죽어갈 때 소설의 부활을 예언한 작품이란 평가를 얻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적 역사와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을 유머로 녹여냈다 한다. 그는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독특한 표현방식을 고안해냈다. 죽음의 세계는 삶의 세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부재와 현존은 한 사물이나 현상의 동시적 속성이라 생각했다.
사촌간 근친 결혼을 하고 이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자, 고향을 멀리 떠나와 '마꼰도' 라는 고립된 도시를 세우면서 가문 이야기는 시작된다. 백년의 고립은 백년의 고독을 쌓았으며, 이들은 고독을 피하려 죽거나 근친상간에 함몰된다. 성은 고독을 해소하고, 동시에 고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은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 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에게 먹히고 있다.’ 는 집시의 예언서처럼 6 대에서 종말을 맞는다는 이야기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깊숙히 내재된 고독과 근친상간의 문제를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마르케스는 ‘허리 밑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관대히 용서할 수 있는 실수’라 말하듯 그들 문화의 특이성을 볼 수 있다. 근친 결혼을 하면 자식이 돼지꼬리를 달고 나온다는 속설이 퍼져있음에도 그들을 제어하지는 못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쥬피터의 아내 헤라는 그의 누이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시원이고 인류의 타락으로 내려진 대홍수의 정화 과정을 거친다. 유일한 생존자인 노아 부부로 부터 인류가 퍼졌다면 그들의 자손간 근친결혼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와 같이 신화와 성경에서도 근친 결혼이 비일비재하지만 무슨 이유로 근친 결혼 금지가 현세의 도덕 기준이 되었고 위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과학적으로 근친 결혼은 열성인자를 대물림하여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지만 근대 왕족들간에도 흔했고, 지금도 성폭행의 많은 부분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아우렐리아노 가문이 고독을 피할 수 있을 기회는 있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선조들은 마꼰도에서 바다로 가는 길을 내고자 노력했었다. 큰 도시로 간 자손도 있었고, 파리, 로마로 간 자손도 있었다. 문제는 강한 귀향 본능이 고독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마꼰도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숙명 의식이 그들을 고독 속으로 몰고 갔다.
복문으로 이루어진 문체가 매우 낯설고 읽기 어렵다. 어떤 한 문장은 4쪽이 넘어 놀라기도 했다. 6 대에 걸친 인물들의 이름들이 남자는 아르까디오, 아우렐리아노, 여자는 레메디오스가 되풀이 승계 되어 누가 누군지 혼란스러워 자주 가계도를 들여다 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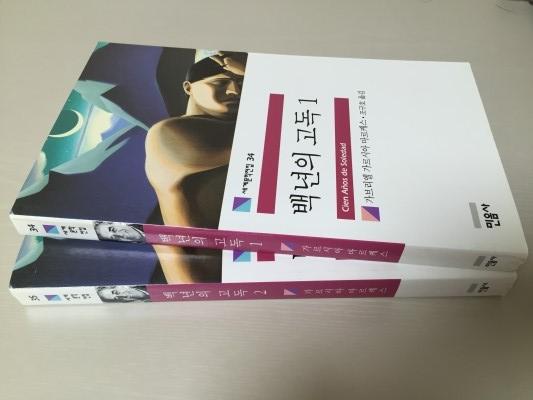
'FEEL >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국 (1948) / 가와바타 야스나리 저 / 유숙자 역 (0) | 2020.12.09 |
|---|---|
| 변신이야기 (17) / 오비디우스 저 / 이윤기 역 / 민음사 (0) | 2020.12.05 |
| 심판 (2015) /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 전미현 역 (0) | 2020.10.01 |
| 카탈로니아 찬가 (1938) / 조지 오웰 저 / 정영목 역 (0) | 2020.09.28 |
| 수레바퀴 아래서 / 헤르만 헤세 저 / 김이섭 역 (0) | 2020.09.11 |